건축 이론을 접한 사람이라면 아키그램(Archigram)을 한 번쯤은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키그램은 영국의 건축가 집단으로서 주로 1950년도에 활동했다. 그들은 소위 말해 2100년도에나 나올 수 있는 미래 공간을 도면으로 형상화하고, 모델로 창조해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나 나오던 ‘워킹 시티(1964)’가 하나의 예시가 되겠다. 이 그룹명의 어원인 텔레그램은 그 당시의 ‘퀵’으로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명분에 맞게 ‘건축계의 가장 빠른 뉴스’를 모토로 삼으며 활동했다.
이렇게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그들의 건축 성향은 바틀렛 건축학교의 톡톡 튀는 학풍과 매우 잘 맞아서 그들은 자주 바틀렛의 앞문을 넘나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소 유명세는 바틀렛의 월례 행사인 인터내셔널 렉처 시리즈에 등장했을 때의 열기만 못하다. 이 행사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는 저녁 강연으로, 평소 접하기 힘든 굴지의 건축가들이 자주 초대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작년에는 헤더윅 스튜디오와 아틀리에 바우와우가 등장했다. 이번 학기에는 아키그램의 멤버 마이클 웹이 강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그의 인기답게 강연 시간이 10분이나 지나도 사람들이 다 착석하지 못하였다. 그는 많이 노쇠해 보였지만, 그의 성(姓)처럼 거미 같은 긴 팔다리로 마이크를 만지며 의자에 여유롭게 앉아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지긋이 바라보며 가까이 착석한 교수들에게 시시콜콜한 농담을 던지곤 했다.
강연은 그가 지금도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소개 위주로 짜였다. 그에게는 사실 ‘작업’이라는 단어보다 ‘시각을 많이 활용하는 탐구’가 더 적확한 표현이겠다. 전자가 주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목표로 하는 탐사라면, 후자는 완성품이 무엇이 될지 본인도 모르는 탐사이다.
이번 강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재방문’이다. 그는 몇십년 전 본인의 스케치들과 도면들을 건져 올려 자신의 옛 구상들을 ‘재방문’했고, ‘재질문’했으며, ‘재정립’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많은 스케치들과 도면들이 창조됐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재방문하는 과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본 나의 작업은 항상 형편없다. 거의 항상 부족할 것이고, 항상 더 고쳐야 할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부족한 점들을 메꾸고, 고치고, 채우고, 획기적으로 기록하고, 소통하려 노력한다.”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는 노년 건축가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작품의 유명세는 물론이고 자신의 건축 철학의 완성도에서조차 만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본 팔십이 넘은 그는 다만 지금조차도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가 본인의 옛 포트폴리오를 재방문하여 새로운 그림과 도면, 생각을 전달한 2시간여의 강연이 끝났다. 이번 강연은 15분 분량의 ‘아키그램 오페라(1972)’ 상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무엇보다 아키그램을 가장 잘 표현한 글귀다. “Archigram didn’t solve problems, it speculated on possibilities, it said what if? not do this!” <이지우 학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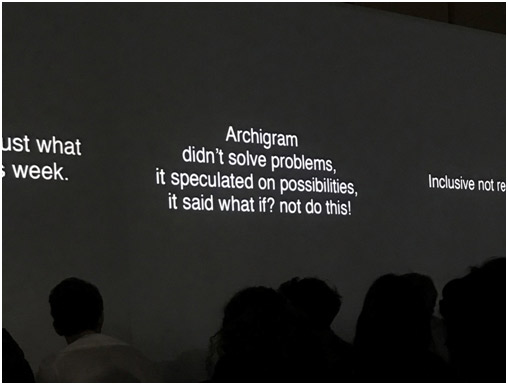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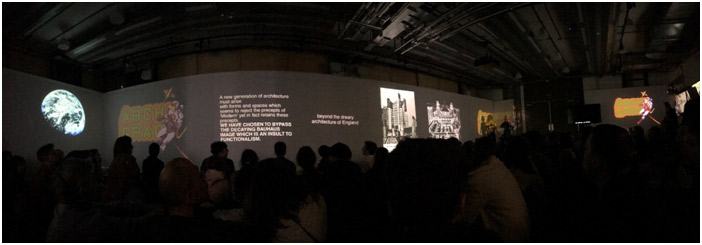
▲ SPACE, 스페이스, 공간
ⓒ VM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